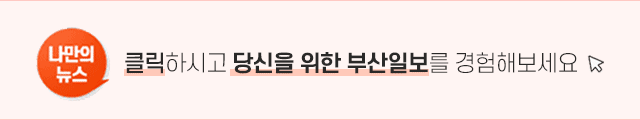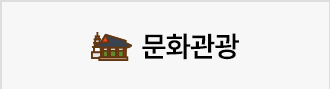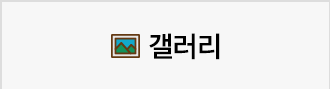된장 소금 등으로 충분...별것 없는게 외려 충만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먹는 것이 그대로 사람을 만든다'며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라고 했다. 밥상 위의 그릇처럼 동그란 미소를 짓고 있는 하림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먹는 것이 그대로 사람을 만든다'며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라고 했다. 밥상 위의 그릇처럼 동그란 미소를 짓고 있는 하림 스님.부처님 오신날이 눈앞이다. 이번 주는 절에 가서 밥을 먹었다. 절밥. 화려하지 않다. 소박하고 담백하다. 꽃이 피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지만 꽃이 지는 것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이 사십을 넘겨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나이에 접어들면 순응을 알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문필가 앙드레 모르아 같은 이는 "나이 사십이 넘으면 삶에 '그림자'가 조금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했다.
절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약한 것의 애처로움을 먹는 것이고, 순응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소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웬 구구한 잡소리인가? "맛있다, 맛있다 절 밥!"이라고 단순명쾌하게 섬기면 될 터. 절집, 두 곳을 갔고 절밥, 두 그릇을 비웠다.
# 범어사-금정산에서 마음의 점 찍다
금정산 범어사 오르는 길, 나무 터널의 그늘이 시원타. 서늘하고 푸른 향기, 속세에서 가장 깊은 냄새다. 신록이다. 공양간에서 피어오르는 밥 냄새가 배꼽시계를 비튼다. 따르릉~. 오전 11시 30분. 회색 법복을 입은 보살들이 벌써 공양간의 자리를 띄엄띄엄 차지하고 앉았다. 등산복 차림들도 조금 섞였다.
60대의 공양간 보살은 "매일 점심으로 300~400인 분을 가스밥솥에 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야의 밥알 몇개를 집어 입속에 넣는데 밥티 하나가 입술에 '보기 좋게'(?) 붙어버린다. 관세음보살~. 밥 대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누런 것은 시주로 들어온 떡을 녹인 것. 쌀도 모두 보시로 들어온 것이다. 그것을 다시 대중공양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빈 바퀴로 크게 돌고 도는 절밥 먹는 일이여!
범어사에서 절밥을 짓는 가스밥솥 기계는 이른바 군대 짠밥을 찌는 것과 같다. 가스밥솥 기계에는 솥 2개를 넣을 수 있는데 솥 1 개로 쌀 4되, 40인분을 찐다. 공양간 경력 3년차, 10년차 두 보살이 사람 수 보아가며 익은 솜씨로 밥을 계속 찌고 있었다.
오늘 고작 두 사람이 몇백 명을 먹이는 것이다. 아침 점심은 40~60인분에 불과하고 역시 점심이 하이라이트다. 부엌 한쪽에는 오전에 몸을 부린 일꾼들이 반찬 한두 가지와 양푼이 사발을 간단하게 놓고 쭈그려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포유동물의 가장 순한 자세 같았다.
도관 범어사 총무국장 스님은 "절의 음식은 된장, 소금, 다시마 우린 것으로 다 된다. 참기름 대신 들깨기름을 쓰고, 어쩌다가 조청고추장으로 맛을 내기도 한다"고 했다. 별것 없는 그게 절밥이다. 별것 없는 것들로 사람들은 마음에 점 하나씩을 찍는 것이다. 점심(點心)!
진짜 별거 없었다. 1식 3찬, 그리고 시락국 한 그릇의 스테인리스 식판. 참 간단하다. 깍두기 꽈리고추지에 시금치 콩나물 무 무침 중에서 서너 가지 반찬을 골라먹는다. 밥과 반찬을 식판에 떠먹는 보살 처사님네들의 표정은 의연하고 그저 담담하다. 40~50대도 있고, 60대 이상이 많이 보인다.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이들의 담담한 표정들이다. 60대 보살은 밥그릇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 밥과 반찬을 담았다. 한 그릇 세상의 구현이다.
별거 없는데 그게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한 보살은 "절밥 맛있다. 나물이 첫째로 맛있다"고 했다. 나물이 첫째가 아니고 나물이 전부다. 하나를 전부로 알고, 달게 먹는 것이 절밥의 맛이었다. 기자는 나철회 범어사 문화팀장과 함께 아침에 남은 반찬을 합쳐 그냥도 먹어보고, 비벼도 먹어보았다.
단백했다, 깔끔했다. 경선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스님은 "밥 먹는 일 하나에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외남(65·부산 동래구 온천3동) 보살은 "시래기 된장국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자신이 사용한 식판을 씻으며 말했다.
# 미타선원-절에서 자장국수를 먹다
부산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의 미타선원. 도심 속 선원에서는 이날 점심 메뉴로 자장을 끓여놓았다. 절에서는 가끔 카레밥과 자장밥을 먹는다. 낮 12시에 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울렸고 선방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이 하나둘씩 공양간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밥과 반찬을 그릇 한두 개에 소소하게 담아 단출하게 먹었다. 사람의 오장육부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은 저 단순한 한 끼 정도만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그뿐이다.
주지 하림 스님과 마주한 밥상에는 반찬 네 가지와, 자장과 국수가 올려져 있다. 절에서 처음 먹어보는 자장국수였다. 밥상에는 보시로 들어온 상추가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상추가 아삭아삭, 빛가루처럼 입속에서 부서졌다. 그냥 그대로 맛있었다. 하림 스님은 "진실로 먹는 것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미타선원에서는 2006년부터 사찰음식 강좌(051-253-8687)를 열고 있다. 잊혀져 가는 맛과 요리법을 되찾기 위해서다. 음식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사찰음식 연구의 권위자 홍승 스님이 매주 수, 목요일 강좌를 열고 있다. 이날 홍승 스님은 출타 중이었다. 사찰음식 강의실 앞에는 가죽나무의 줄기를 말리고 있었다.
먹는 게 화려해진 세상에서 저런 것을 먹는다는 게 새삼스러웠다. 하림 스님은 "고기 1kg를 사육하는 데 채소가 몇 kg이나 들어간다. 그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소금의 중요성을 말했다. 된장도 소금으로 만들고, 간장도 소금으로 만든다. 중요한 하나면 된다. 그게 천일염이다.
한국 음식, 사찰 음식의 저간을 꿰고 있는 하나, 소금! 문득 화두 하나가 떠올랐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스님은 "우리 소금에서는 짠맛뿐 아니라 단맛도 난다"고 했다. 그런 것이 다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타선원 자장국수가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것도 마음에 점 찍는 점심!
글·사진=최학림 기자 theos@busanilbo.com
절밥, 우리 음식 맛집
절밥 맛을 내는 음식점을 조리기능장인 조용범 동의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에게 물었다. 조 교수는 정림, 죽림산방, 흙시루를 1차로 추천했고, 탐바루, 예이제를 추가로 추천했다.
절밥의 전제는 육식이 덜 들어가고, 채소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음식이었다. 조 교수는 "모든 음식에는 고유한 색깔, 색(色)의 미학이 있다. 지나치면 인위적인 것이 된다. 자연산 약초의 맛과 색깔을 그대로 살리고, 약에 가까운 약선 요리를 하는 곳들이 1차로 추천한 세 곳이다"라고 했다.
△정림(051-552-12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시장 안)=정영숙 대표는 약선요리 계승의 공로로 대한민국 지식경영 대상을 받기도 했다. 돌솥밥정식 1만5천원, 코스 2만5천원(식사 버섯탕수육 연어조림 등).
△죽림산방(055-374-3392,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30년간 초근목피를 연구해 왔다는 약선요리 연구가 권민경 영산대 약선조리 전공 교수가 운영하는 곳. 약선 음식 코스 2만원, 2만9천원, 3만8천원(대나무밥 각종 약초요리 등).
△흙시루(051-722-1377,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향토건강음식을 지향하는 업소. 단호박에 갈비찜과 유황오리를 넣어 쪄서 먹는 것이 특징(각 4만원, 3인분). 정식 7천원, 1만2천원. 보쌈 2만5천원.
△예이제(051-731-1100, 부산 해운대구 중동)=음식을 놋그릇에다가 작가들의 도자기에 담는다. 궁중요리로 알려져 있다. 3만3천원, 4만3천원부터 11만원까지 5종류.
△탐바루(051-636-5866,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음식을 깔끔하게 담아내기로 소문이 나 있다. 한정식 코스 2만5천원, 3만5천원부터 10만원까지 5종류. 최학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