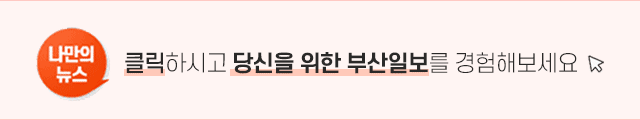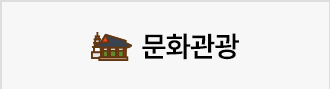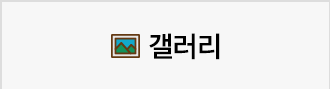인공조미료를 버렸다, 재료의 궁합을 살렸다

"제대로 만든 요리,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좋다."
오늘 소개할 집의 메뉴판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이다. 제대로 된 한정식을 선보이고 있는 곳,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정식집 '효재'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시작한 지 올해로 7년 째. 부산에선 한정식집으로 드물게 마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째 이름이 좀 낯설다.
"'탐바루'라는 이름으로 지난해까지 영업했어요. 그런데 상표권 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초 이름을 바꿨어요. 저흰 음식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줄 알았지, 다른 분야는 몰랐으니…." 우미경 사장이 말끝을 흐린다. 이름에 대한 아픔이 많았던 모양이다.
우 사장은 특급호텔 주방 출신 요리사이다. '효재'가 처음 시작될 무렵, 선배의 부탁으로 메뉴 구성에 도움을 주며 이 집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효재'를 시작했던 노정규 사장은 지금 우 사장과 한 방을 쓰는 부부가 되었다.
"당시 한정식집이 여러 곳 있었지만 비싼 재료를 가지고 손이 덜 가는 음식을 내놓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효재'를 시작하며 음식 체계와 궁합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준비했어요.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제철 재료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방의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주방에선 난리가 났어요. 개업을 앞두고 주방장이 이렇게 힘들면 일할 수가 없다고 그만두는 사건까지 생겼으니까요."
조미료를 넣지 않는 심심한 맛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먹는 느낌이 없이 무덤덤하다'는 항의도 있었다. 하지만 우 사장은 이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효재'의 음식 철학에 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효재'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음식이 등장한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 어머. 이건 뭐예요? 너무 예쁘다!" 나오는 음식마다 감탄사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 접시 위에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한다. 한입 크기로 만들어 일일이 장식을 하고 색의 조화를 맞춘 후 재료들 간의 궁합을 살려 향과 맛을 최고로 끌어낸 그야말로 '작품'이다.
"이건 석류 모양으로 만든 닭고기고요. 저건 비단두부인데 안은 부드럽게, 겉은 바삭하게 만들어봤어요. 꽃을 올려서 구운 삼색화전은 주방 식구들이 일일이 빚어야 돼요. 구절판과 오색정과는 궁중 요리의 화려함을 보여주네요. 검은콩 소스로 버무린 샐러드도 드시고요. 들깨우엉탕은 우리집 최고 인기메뉴인데…."
사실 우 사장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눈이 호강하고 코가 향긋하고 입이 즐거운, 음식의 최고봉이라는 칭찬을 보내고 싶다. 궁중요리 진상 5만 원, 선상 3만 원, 점식특선 1만 원. 매주 화요일 휴무. 점심 낮 12시~오후 2시30분. 저녁 오후 5시~9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황실예식장 맞은편 GS주유소 뒷골목. 051-636-5866. 글·사진=김효정 기자 ter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