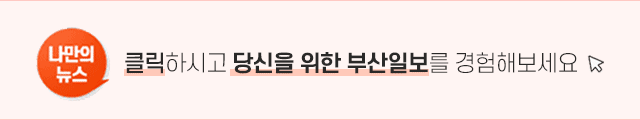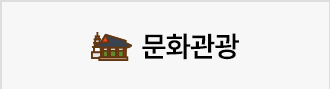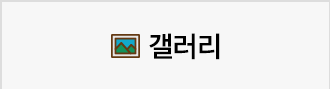속 좁은 편견으로 네 속을 몰랐구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의 '요로코비통골뱅이'에서 차려낸 삶은 통골뱅이(왼쪽).'고둥계의 귀족'으로 손꼽히는 백골뱅이는 흰 속살의 쫄깃한 식감과 은근한 향이 특징이다. 오른쪽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장안고디탕'의 다슬기회무침.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의 '요로코비통골뱅이'에서 차려낸 삶은 통골뱅이(왼쪽).'고둥계의 귀족'으로 손꼽히는 백골뱅이는 흰 속살의 쫄깃한 식감과 은근한 향이 특징이다. 오른쪽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장안고디탕'의 다슬기회무침.'골뱅이'. 전자우편 주소를 불러줄 때는 알기 쉬운데 이걸 음식으로 접할 때는 가끔 헛갈린다. 바다에서 잡히는 둥글둥글한 원추형 모양의 고둥. 그런데 비슷한 모양이 많아서 통조림에 담긴 것이나, 회무침으로 나올 때 어떤 골뱅이가 들어갔는지 알쏭달쏭하다. 심지어 민물고둥인 다슬기도 슬쩍 끼어든다. 지역마다 다른 이름을 갖기로 유명한 다슬기를 일부 지역에선 골뱅이로도 부르는 것이다. 어쨌거나 껍질을 까고 나면 드러나는 속살의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향미가 일품인 것은 마찬가지. 내친김에 초읍동의 '요로코비통골뱅이'에서 '고둥계의 귀족'으로 불리는 동해산 백골뱅이를 맛봤다. 여기에 다슬기의 경상도 명칭인 '고디'를 앞세운 부곡동의 '장안고디탕'에서 다슬기 회무침과 국물의 맛을 비교해 봤다.
"통조림 골뱅이는 잊어 주세요"
■초읍동 '요로코비통골뱅이'
"골뱅이 전문점? 그거 하나로 장사가 되나?"
고개를 갸우뚱한 것은 순전히 '통조림 골뱅이'의 후진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다지 고급스럽지도 않거니와, 이걸 무쳐 놓으면 속살보다는 초장맛만 남았던 허무한 기억이 많아서다. 게다가 서울에는 을지로 같은 곳에 전문점 거리가 형성될 정도이지만 부산은 그에 비하면 인기가 별로다. 저렴하고 풍부한 횟감과 해산물의 대체재가 있어서일 것이다.
초읍에 '고둥계의 귀족'으로 손꼽히는 백골뱅이(참골뱅이) 전문점이 생겨 주당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골뱅이라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삐딱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 접시 가득 삶겨서 나왔는데, 비주얼에 압도되고 만 것이다. 손에 쥐일 정도로 제법 큰 놈들이 속살을 삐죽이 내민 채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 볼 만했다.

살점을 꺼내 보니 도톰하게 오른 살과 내장이 스르륵 한꺼번에 딸려나왔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에 착착 감기고, 특유의 은근한 향이 입안에 여운으로 남는다. 얇고 잘 부스러지는 껍질, 그 속의 흰살. 어디선가 먹었던 것 같은데! 아하, 일식집이나 횟집에서 곁들이(쓰키다시)로 나오던 거네! 가끔 감질나게 먹었던 '귀하신 몸'이 수북이 쌓여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재현(34) 사장은 "경북 포항과 울진에서 통발로 잡은 것을 받아 쓴다"고 설명했다. 양식이 안 되니 자연산일 수밖에 없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살아 있는 걸 삶아 내니 싱싱하다. 또 요즘 수입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렇게 국내산 생물을 바로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걸 먹고 나면 통조림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그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주문이 들어오는 족족 삶아 내는데, 이게 20분쯤 걸린다. 주문이 밀리면 더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요즘은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오는 단골이 꽤 늘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서 나온 회무침에서도 기존의 골뱅이무침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간단히 무너졌다. 소면·야채와 함께 살점을 씹는 식감이 즐거움을 준다.
꼬치에 꿰어 굽거나 찜으로 만들면 어떨까? 크림파스타에 응용하면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 텐데! 프랑스의 고급 달팽이를 요리해 놓은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삶고 무친 골뱅이를 잘 먹고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 조 사장은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 중이라면서 맞장구를 쳤다. 백골뱅이, 맛의 변신이 기대된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78의1. 통골뱅이 소 1만 8천 원, 중 2만 3천 원, 대 2만 8천 원. 통골뱅이 무침 1만 8천 원. 오후 5시∼오전 2시. 051-818-4560.
쓰린 속 달래 주는 푸른색 '마법 국물'
■부곡동 '장안고디탕'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 지인이 "속이 부대낄 때 찾는 곳"이라면서 부곡동의 다슬기전문점 '장안고디탕'으로 이끌었다. 밥상은 집밥처럼 정갈하고, 다슬기 국물이 시원하다는 게 추천 이유다.
식당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작은 가게다. 들어섰더니 남편 남필우(68) 씨가 손님을 맞고, 주방에서 부인 성난순(59) 씨가 분주히 손을 놀려 상을 차리고 있다.
먼저 '고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다슬기는 충청도에서는 올갱이, 전라도에서는 대사리로 불린다. 경상도에서는 고디로 불리는데, 아마도 '궁둥이'가 '궁디'가 된 것처럼 '고둥'을 '고디'로 불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럴싸하다. "그래도 부산사람들도 낯설어하세요. 지나가다 가게 문을 빼곡 열고서는 '고디가 대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다슬기를 부르는 이름이 각양각색이듯 지역마다 요리법에 차이가 있다. '장안고디탕'은 각 지역의 다슬기국을 다 차려낸다. 경상도에서 가장 즐기는 맑은탕은 '고디진국'으로 씌어 있다. 다슬기 속살에서 우러난 익숙한 푸른색 국물이다. 보통 부산사람들은 여기에 매운 고추로 넣어 만든 다진 양념(속칭 다대기)을 풀면 칼칼해지는 맛에서 시원함을 느낀다.

이 밖에 충청도식 '올갱이국'은 얼큰하게 끓인 것이고, 들깨를 넣어 걸쭉하게 만든 '고디탕'도 메뉴판에 올라 있다. 채소류를 넣고 냄비에 끓이는 고디전골도 별미일 듯싶다.
그런데 지역별로 끓이는 방법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걸 '국'과 '탕'으로 구별해 놓으니 헛갈린다. "손님들이 걸쭉하게 만든 걸 탕으로 여기고 맑은 것은 국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국'의 높임말이 '탕'(湯)이어서 동일한 국물음식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식탁에서 쓰임새가 달라지고 있다.
고디진국과 올갱이국에 고디회무침 작은 것을 함께 주문했다. 국물은 다슬기를 잘못 끓이면 나오는 특유의 씁쓰레함을 잘 잡아내서 훌훌 들이켜기 쉽다. 듣던 대로 반찬도 정갈하다. "시장에서 사다 쓰는 것 없이 반찬을 직접 만드는데, 매일 종류를 바꿔서 차려 낸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다슬기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다슬기는 기름지지 않고 편안해서 좋다. 특히 집밥처럼 먹을 수 있을 때가 가장 좋다.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일 텐데 인근의 구청과 경찰서 직원들 중에 단골이 많단다.
※부산 금정구 부곡3동 24의 1. 금정보건소 도로 건너편. 고디진국·(들깨)고디탕·고디된장·충청도식 올갱이국 각 6천 원, 고디파전 1만 2천 원, 고디회무침·고디전골 각 소 2만 원·대 3만 원. 051-513-0108. 오전 9시∼오후 9시. 김승일 기자 dojune@busan.com
사진=블로거 '챨리'(blog.naver.com/lim857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