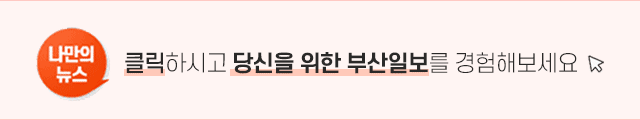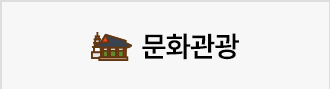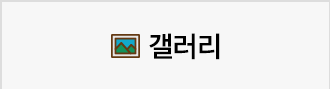국물이 있어 더 좋은 우동과 어묵
 1950∼60년대 동해남부선의 추억을 되살려 실내를 꾸민 중앙동 '동해남부선'에서 젊은 여성들이 우동을 먹고 있다. 이 집은 육수를 끓여내는 방식에서 일본식과 다른 '부산식 우동'을 표방하고 있다.
1950∼60년대 동해남부선의 추억을 되살려 실내를 꾸민 중앙동 '동해남부선'에서 젊은 여성들이 우동을 먹고 있다. 이 집은 육수를 끓여내는 방식에서 일본식과 다른 '부산식 우동'을 표방하고 있다.우동과 어묵(오뎅). 찬바람이 불어 따뜻한 국물이 그리울 때 떠오르는 단골 메뉴다. 둘 다 일본에서 건너왔지만 지금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일본의 아류일 뿐이라고? 천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산식'이라 말할 수 있는 맛의 차별화도 눈에 띈다. 그 차이를 알고 먹으면 모르고 먹을 때와 맛이 같을 수가 없다. 국물맛을 보자.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가 기본이 되고 달짝지근, 짭조름하면서 자작하게 만드는게 일본식 육수라면 부산 사람들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내 시원한 맛을 즐긴다. 그래서 해장국 대용으로 요긴하다. 우리고 토핑하는 방식도 다르다. 중앙동의 '동해남부선'과 연산동 '무비오빠'에서 뜨끈한 국물과 함께 부산식 우동과 오뎅을 음미했다. 두 곳 모두 내공이 깊다.
■ 중앙동 '동해남부선'
폐선된다던 동해남부선이 원도심 중앙동에 나타났다. 고즈넉한 송정역과 기장역 역사를 본 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왁자지껄한 공간이 펼쳐진다. 철도역의 매점에서 흔히 보는 목로가 떡하니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다. 후루룩 쩝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국물을 들이켜는 사람들. 아스라한 1950∼60년대 동해남부선의 대합실 풍경이다.
철도역 매점 연상시키는 우동집
멸치 국물에 학꽁치 튀김 '부산식'
지난 1985년 해운대 미포에 자그마한 우동집이 문을 열었다. 상호는 '동해남부선'. 해운대 토박이로 그 철길을 따라 학교를 다녔던 정양호(68) 씨는 자신의 추억을 되살려 철도 노선을 상호로 정하고 대폿집 느낌의 우동집을 차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전세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해운대해수욕장 근처로 옮겨야 했던 것. 이자카야 '붉은 수염'으로 상호가 바뀌면서 '동해남부선'의 우동국물은 추억으로 남았다.
한데, '붉은 수염'을 돕던 아들 준규(38) 씨가 우동 맛의 재연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달 중앙동에 '동해남부선'을 다시 열었다. 옛 철도를 배경으로 부산의 추억을 되살린다는 콘셉트로 실내를 꾸몄다. 그는 "일부러 예스럽게 인테리어했다"고 했는데, 과연 승강장의 이정표 간판이 메뉴판이 되고, 송정역·기장역사와 기관차 나무 모형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건 '부산식 우동'을 표방한다는 점이다. 일본식 가케우동은 끓는 물에 면을 넣어 삶아내고, 그 위에 육수를 얹어 낸다. 반면 '동해남부선'은 육수를 냄비에 붓고 여기에 면을 삶아 낸다. 육수의 맛이 면에 배고, 면의 전분은 육수로 빠진다. 육수부터 다른데, 가다랑어포와 버섯으로 국물을 내면서 짜고 단 일본식과 다르게 멸치와 다시마를 써서 기본적으로 시원한 맛이 바탕을 이룬다. 또 쑥갓이 들어가는 것과 파만 조금 얹은 것도 두 맛의 차이다. 준규 씨는 "이런 차이가 부산식 우동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튀김우동에는 학꽁치 튀김이 오른다. 새우를 바삭하게 튀겨내는 일본식과 달리 학꽁치의 튀김옷은 국물을 만나면 퍼석해져 풀어지게끔 만든다. 튀김이 국물에 배어 구수한 맛을 더하게 한 것이 부산식이라는 것이다.
기억에서 영영 사라질 것 같던 '동해남부선'. 그곳에 가면 헐레벌떡 뜨거운 우동국물을 들이켰던 오랜 추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부산 중구 중앙동2가 24의2.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1번 출구에서 백산기념관 방향. 튀김·유부·냄비우동 각 5천 원, 스지오뎅탕 1만 8천 원, 모둠튀김 2만 원, 황태포 1만 5천 원. 오전 10시∼오후 10시. 051-255-1261.
■ 연산동 '무비오빠'
일본말 오뎅을 어묵(실은 '가마보코')으로 순화해서 쓰라고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입에 붙어 어쩔 수 없는 경우 오뎅으로 쓴다고 치자. 그래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일본에서 오뎅은 제법 고급스러운 요리였는데, 우리나라에선 길거리 음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생선살 비중 80% 넘는 '진짜 魚묵'
미더덕 젓갈 양념 "딴 데선 못 먹지"
흔히 접하는 오뎅은 뜨거운 육수에 오래 담겨 있으면 퉁퉁 붇게 된다. 어육의 함량이 낮은 대신 전분(대체로 밀가루)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묵보다는 밀가루떡으로 부르고 싶을 때가 있다. 값싼 재료로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건 10개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어묵을 꼬치에 꿰어 육수에 끓여 놓고 주인과 손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어떤가?
 |
| 동해남부선의 우동(위)과 연산동 '무비오빠'의 프리미엄급 오뎅. |
연산동의 오뎅 가게 '무비오빠'에서 목격하는 낯선 풍경이다. 손님들은 주인장으로부터 어묵의 특성을 듣거나 추천 받는다. 대체 어떤 어묵이길래? 생선살의 비중이 80%를 넘나드는 프리미엄급이란다. 그래서 가격이 제법 세다. 어묵 꼬치 하나에 비싼 건 2천 원, 3천 원씩 한다. 주인장 배기석(52) 씨는 "단언컨대 한 사람이 어묵 꼬치 3개를 초과해서 먹는 모습을 못 봤다"고 했다. 생선살의 비중이 높아 금세 배가 불러진다고.
국물에서도 남다른 특징이 있다. 가다랑어포와 간장을 써서 짜고 달게 만드는 일본식과 달리 시원한 멸치육수가 기본이다. 이는 '오뎅제일주의' 때문인데, 오뎅은 어묵 맛 자체가 좋아야지 국물은 엑스트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걸 '부산식 오뎅'으로 불러도 좋다고 했다. 대연동의 '미소오뎅'을 벤치마킹해서 확립한 방식이라고.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 어묵의 맛과 육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질겅질겅 씹다가 메뉴판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미더덕젓갈'. 이 집에선 어묵을 찍는 양념이 젓갈이다. 주인장이 찍어 먹던 걸 손님들에게 냈더니 반응이 좋아 메뉴에 올렸다고.
'무비오빠'의 좌석은 디귿자형 바 형태다.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 느낌이 팍팍 난다. 2차로 들러 불콰해진 손님들끼리 의기투합해서 가무로 발전하거나, 차수를 늘려 떠나는 일이 다반사다.
※부산 연제구 연산5동 709의 15.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두 번째 골목안. 어묵꼬치 1천 원, 1천500원, 2천 원, 3천 원. 미더덕젓갈 5천 원. 2·4주 일요일 휴무. 오후 6시~오전 2시. 051-866-1236. 김승일 기자 dojune@busan.com
사진=김병집 기자 k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