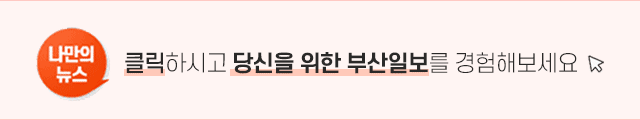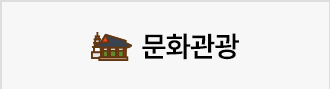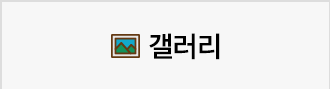영화 '낯선 자들의 땅'.
영화 '낯선 자들의 땅'.원전이 터졌다. 삶을 가능케 했던 집과 마을이 불모의 땅이 된다.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살뜰했던 가족조차도 서로에게 위안이나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 어디도 방사능의 자장에서 안전한 대피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불모지에서 먼저 떠나간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건져 올려 살아가는 아직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자들은 삶이 깃든 물건들이나 생존 가능한 음식을 수집해서 살아가고 어떤 자들은 기억을 묻거나 묻힌 기억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거주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어떤 자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神)에게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량한 땅에서도 삶은 쉽사리 포기되지 않는다. 임시 대피소가 삶의 희망이나 전망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곳을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바깥 세계는 좀체 이들을 위해 문 열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바깥의 안전한 세계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역설적으로 이주는 오염된 이들이 안착할 수 없고, 바다 위에서 수장될 뿐이다. 그들에게 오히려 이주는 죽음이다.
원전 사고 이후 비극적 삶 다룬
오원재 감독의 '낯선 자들의 땅'
한국 사회 위기 고스란히 포착
예산 부족으로 CG 볼 수 없지만
부산 출신 감독 연출력으로 극복
부산독립영화제서 만날 수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어쩌면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어느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을 법한 어떤 이야기. 그래서 더 참담하고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오원재 감독의 영화 '낯선 자들의 땅'. 영화는 원전이 방사능을 일으킨 이후의 삶을 다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갖는 위기들을 고스란히 포착한다. 재난과 국가, 학살, 죄와 구원, 기억과 역사, 기만과 진실이 착종된 영화의 세계는 대피소를 모색하기 힘든 불모의 풍경들이다. 물론 이런 상상력은 어쩌면 원전이 인접한 '부산영화'만이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주변부적 역량이 고스란히 길어 올려진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듭되는 경제적 위기로 파괴된 공동체와 생존이 지상명령이 되어버린 곳에서 이웃의 죽음을 통해서만 삶의 가능성을 보장받는 세계는 그 누구에게도 출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죽음으로 점철된 오염된 땅을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는 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장소로 그려지는 것은 충격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다. 탈주를 도모하던 인물들이 해안선에 이르러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휴가를 얻은 주인공 정철만이 겨우 살아남는 것으로 볼 때, 영화는 현실 또한 감옥과 다름없음을 암시한다.
'낯선 자들의 땅'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오 감독의 독립영화다. 단언할 수 없지만 많은 독립영화가 그러하듯 이 영화 또한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 그 흔한 CG도 볼 수 없으며 원전 유출 이후 폐허가 된 공간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영화는 스크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인물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는 영화는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마조마하게 한다. 예산의 한계를 감독의 연출력으로 뛰어넘고 있다.
물론 독립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상업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움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이미 '전주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호평받았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부산독립영화제'에도 초청돼 2회 상영된다. 사실, 언제 또 이 영화의 상영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 안타깝다. 그것이 어디 '낯선 자들의 땅' 뿐일까. 작은 영화들에 관심을 가질 때 다양한 영화들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필남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