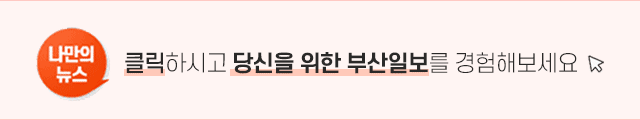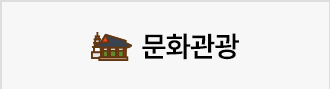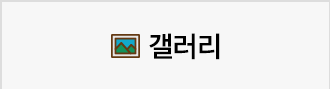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다. 다 때가 되어야 제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낙지가 때가 되었다. 힘 빠진 소도 낙지 서너 마리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 일제가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에게 흥분제 대신 먹인 게 타우린인데, 낙지 성분의 34%가 바로 이 타우린이니 말 다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뜨끈뜨끈한 연포탕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연포탕이 무슨 뜻일까? "낙지를 한자로 연포라고 하는것 아닌가?" 아니다. 제대로 알고 먹자. 연포탕(軟泡湯)은 두부를 잘게 잘라 꼬챙이에 꿴 뒤 기름에 부치거나 닭고기를 섞어 국으로 끓인 것을 말한다.
여기에 낙지를 넣고 끓인 연포탕이 일반화되면서 연포탕 하면 낙지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는 '낙지 연포탕'이라 불러야 한다. 민간에서는 낙지를 '낙제어'라 부르며 수험생들에게는 금기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기운내라고 먹여도 괜찮을 것 같다.
숭고하면서도 슬픈 낙지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한다. 겨우내 갯벌 구멍 속에서 운우지정을 나눈 암수 낙지. 봄이 되면 산란해 수정이 끝난다. 숫낙지는 이쯤되면, 아마도 지겨워져서, 필사적으로 구멍을 빠져나오려 한다. 하지만 사랑했던 암낙지는 숫낙지를 그만 홀라당 잡아먹고 만다. 슬프다! 숫낙지의 운명. 그러나 슬퍼 말라. 숫낙지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린 암낙지, 역시나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 알에서 깬 새끼들은 여름까지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자란다. 뜬금없이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 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한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냥 소주잔이나 기울일 것이지….
·깊은 바다에서 우러난 시원한 국물
남도 음식 연포탕을 부산에서 제대로 맛보기는 쉽지 않다. 수소문 끝에 두 집을 찾아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조방낙지'의 연포탕은 국물이 시원하다고 소문이 났다. 이 집 연포탕은 커다란 키조개가 들어간 게 특징이다. 무, 콩나물, 모시조개, 버섯, 인삼, 대추 등 몸에 좋은 것들을 모두 넣고 샤부샤부처럼 만들어서 먹는다.
해운대 일대에서 조방낙지를 시작한 지 5년째를 맞는 김호광 사장. 낙지집을 열기 전에 서울의 무교동 낙지, 전라도 게낙찜 등 전국의 낙지집을 한 달간 일주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제 맛이 안 나 고생했지만 깊은 바다에서 나는 생선 한 가지가 연포탕에 진하디 진한 국물 맛을 내어주었다. 그 생선이 무엇인지는 이 집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전라도에서 먹는 연포탕보다 더 시원한 국물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김씨가 수족관에서 낙지를 꺼내는데 이 녀석이 김씨의 손을 치렁치렁 감는다. 그 또한 살기 위한 투쟁이다. 입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물리기도 한단다. 산 낙지를 가져와 끓는 냄비에다 넣자 뜨거운 육수에 몸을 이리저리 뒤틀면서 그야말로 전전반측한다. 연포탕에는 큰 낙지 세 마리가 들어간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퍼주는 집이라는 느낌이다.
나중에 먹물을 터뜨리니 국물이 더욱 진해서 해장하기에는 그만이다. 국물이 입에 감긴다. 그래서 낙지는 술을 깨면서 다시 술을 먹는 음식이란다. 식사로 나오는 먹물밥도 맛이 있다.
주방을 담당하는 사모님 정순점씨는 "낙지는 작은 놈이 부드러워 맛이 있다. 귀한 손님에게 맛있는 낙지를 드릴 때 '쬐끄만 놈'을 준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연포탕 대 4만, 중 3만원.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연중무휴이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우체국 바로 옆. 051-704-0022.
·뻘낙지에서 나오는 전라도의 향기
힘들게 찾아간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이 집 이름은 엉뚱하게도 '짱뚱어 전문' 집. 짱뚱어탕, 연포탕, 매생이탕 등 전라도 음식 전문이다.
집 주인 김정숙씨가 전라도 벌교 출신이다.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낙지 같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힘이 생긴 건 아닐까?
여기서 말로만 듣던, 꼭 한 번 먹어보고 싶었던 세발낙지(마리당 5천원, 시가)를 만났다. 세발낙지를 처음 먹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가는 발을 콧구멍, 귓구멍에다 사정없이 집어넣으면서 얼굴을 덮치는데…, 내가 낙지를 먹는 게 아니라 낙지가 날 먹는 줄 알았다.
벌교에 사는 김씨의 친정 오빠가 야간에 2시간 거리를 달려 실어 날라준 뻘낙지로 연포탕을 만든다. 다른 집과 달리 육수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낙지를 비롯해 꽃게, 대합, 버섯, 무가 들어가 저절로 육수가 되기 때문이란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다. 여기서도 작은 낙지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발낙지가 제대로 크기 전인 여름철의 낙지를 '거미 낙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일 맛있단다.
여러 해산물이 들어가 섞이며 연포탕 본래의 맛을 보기 힘든 아쉬운 점은 있다. 본래 연포탕보다 국물맛이 탁하다는 이야기이다.
알고 보니 연포탕, 해물탕 따로 시켜 돈낭비하지 마라는 주인장의 배려이다. 잠자코 먹자. 김씨는 "예전에 엄마가 해주던 만큼만 만들자는 각오이다"고 말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영업. 일요일에는 쉰다. 김해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단골이 많다. 짱뚱어탕, 짱뚱어 튀김도 참 별미이다. 연포탕 소 3만, 중 4만, 대 5만원. 찾기가 만만치 않다. 공항로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둑길까지 직진하다 황토오리나라 간판에서 좌회전해서 900m 직진. 051-972-6233.
글·사진=박종호 기자 nleader@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