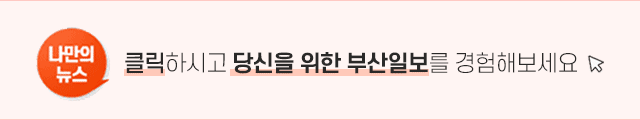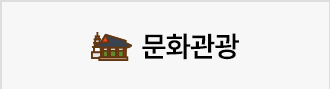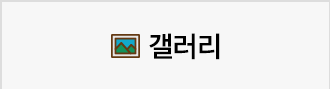40년 넘은 방망이로 밀어낸 칼국수의 깊은 맛

한 날, 지인들과 함께 점심으로 손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는데, 두툼한 방망이가 아닌 밤중의 홍두깨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그 방망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사용했으니까 한 40년은 됐지 싶네요."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었다. 길이 50cm가량에 홍두깨보다 더 두꺼운 그 방망이는 숱하게 많은 반죽을 밀어내 가운데 부분이 닳아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를 생각하니 하찮은 방망이에 대한 경외심까지 이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커다란 작업도마는 면을 썰어내는 칼날이 가닿는 부분이 움푹 패어져 있는 것이었다. 닳은 방망이와, 패어진 작업도마는 삶으로 써여진 경전이었다. 그 경전을 읽어내는 것이 그 집의 칼국수를 먹는 일이었다. "칼국수 한 그릇 얼마라고 했지요?" "2천500원요." 싸다.
단골 지인은 주인 아주머니를 '누부야'(누나야)라고 불렀다. 다름아닌 이 집 이름이 '누나야 분식'이었다. 50대 초반의 주인 아주머니 '누부야'는 면발을 막대로 휘휘 저으면서 손칼국수(사진)를 시원한 솜씨로 끓여냈다. "감으로 끓인다"고 '누부야'는 말했다. 감으로 끓이는 손칼국수는 굵고 가는 면발이 뒤섞여 있다. 육수의 맛이 기가 막혔다. 두 번째 간 날 물어보니 "멸치 디포리 무 등 갖은 것을 넣고 육수를 끓인다"고 했다. 이 집 칼국수에는 고명으로 쑥갓을 올리는데 그 향이 칼국수와 풋풋하게 제격으로 어울리고, '부산 식 국수'를 먹듯이 풋고추 잘게 썬 것과 마늘 다진 것을 식성에 따라 더해 먹는다. 지인은 "해장할 때 이 집에 와서 칼국수를 먹는다"고 했다.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감칠맛의 시원한 칼국수였다. 넣는 것은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대파 깨로 만든 양념장뿐이고 반찬이래야 헐렁한 깎두기뿐이다. 아마도 칼국수의 감칠맛은 닳은 방방이와 패어진 작업도마가 만드는 것일 터였다. 이 집의 메뉴라고 해봐야 각 2천500~3천원하는 손칼국수 국수 비빔국수 당면 라면과, 한 줄에 1천원하는 김밥이 전부다.
이 집 천장에 매달린 메뉴판에 'since 1965'라고 적혀 있다. 44년 됐다는 것. 이곳은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시장이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봉래초등학교(1985년 개교 당시는 개성학교였다) 인근에 있는데 역시 1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다. 지금의 영주시장은 쇄락하여 시장 안에 진아집 종필이집 황산밀냉면 등의 네댓 점포가 있을 뿐이다. 허름하고 누추하여 위생을 따지는 이들은 여기서 감히 감칠맛의 손칼국수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시인 서정주 풍으로 '시장의 누추함은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손칼국수의 맛을 다 가릴 수 있으랴.' 영주시장은 중앙로에서 부산터널 올라가는 사거리 모퉁이의 주차장 뒤편에 있다. 051-469-3198.
최학림 기자 th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