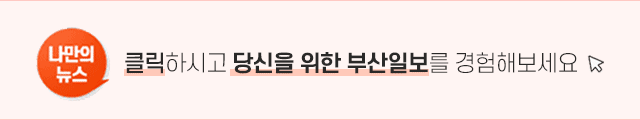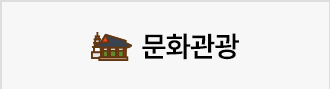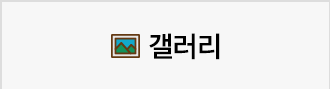누군가를 만나 "밥 한 끼 하자"고 말할 때는 진짜 밥만 먹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밥! 식탁의 주인공인 밥이 맛있는 집을 찾았다. 밥이 맛있어서 반찬을 먹게 되는 집. 기본인 밥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다른 음식은 당연히 맛있다는 보증일 수도 있다. 밥 맛있는 집, 두 곳을 소개한다.
동광동 '부산 숯불갈비'
한우 파는 고깃집
점심 솥밥한정식으로 더 유명
윤기 흐르는 갓 지은 밥
"비결은 제일 좋은 쌀과 정성"

처음부터 지금처럼 장사가 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현준(41) 대표가 10년 전 식당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골목 안에 자리 잡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 사장은 흐린 날이면 주변 사무실에 구두 닦는 봉사를 하러 다녔다. 홍보용 전단을 들고 직접 뛰었다. 그런 정성 덕분인지 지금은 구두를 닦으러 다니지는 않지만 알고 찾아와 주는 손님이 많아졌다.
그때의 습관 때문일까. 지금도 신발 정리를 직접 한다. 그리고는 손님 얼굴과 신발을 함께 기억한다. 손님들은 신발이 바뀐 날 "신발 바뀌셨네요"라고 어김없이 알아채는 것에 대해 신기해한다. 이런 친절함과 정성에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일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솥밥을 주문하면 밥이 나오기까지 10분 정도가 걸린다. 배가 고파도 조금 기다려야 한다. 주문과 동시에 밥 짓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밥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반찬이 차려진다. 반찬을 미리 차려 두면 반찬만 먼저 먹어 밥이 맛이 없을 수도 있기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다.
여기선 밥을 먼저 맛보아야 할 것 같았다. 밥에는 찹쌀이 조금 들어가 있다. 그냥 보기에도 윤기가 흐르고 갓 지어서 떠 줘 밥알이 마르지 않아 맛이 있어 보였다. 반찬도 가짓수만 많고 손이 안 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다.
혹시나 밥 짓는 비결이 있나 해서 물었다. 그는 '정성'이 아니겠느냐며 웃는다. 혹시 쌀이 다르지 않을까? 처음 개업할 때부터 거래하던 가게에서 제일 좋은 쌀로 가지고 오는 거 말고는 비결이 없다고 했다. 무엇이든 좋은 재료에 정성을 더하면 맛이 있다. 그래도 이 집의 밥은 특별한 것 같다.
이 집을 추천해 준 오랜 단골은 사업상 귀한 손님을 만나 '맛있는 밥'이 먹고 싶다고 하면 오는 집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손님도 어느새 단골이 되는 곳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본인만 알고 싶은데 가르쳐 준다며 은근히 아까워하는 눈치다.
이번에 같이 간 지인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연신 칭찬이다. 같이 나온 반찬도 밥이 맛이 있으니 더 맛있게 느껴진다. 그는 "반찬 더 드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
손님 마음을 눈치채고 마음 편안히 이야기해 주니 좋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도 친절하게 모자라는 것은 없는지 챙기고 있다.
신나게 일하는 그 덕분에 가게 안이 밝은 기운으로 넘친다. 잘 먹고 나서는 길에 인사는 "다음 번에 신발 바뀌면 아는 척할게요"다. 정말 내 신발을 기억할지 궁금해서 다시 가 봐야겠다.
점심특선- 솥밥 한정식 1만 원, 등심 전골(2인) 2만 5천 원, 곱창전골(小) 3만 원. 영업시간 9:00~22:00. 일요일 휴무. 부산 중구 백산길 3-1. 051-247-6262.
부평동 '오봉실비'
맛있는 밥 생각나면 가는 곳
"지금도 벅찬데 욕심 없어요"
압력밥솥에 조금씩 짓는 밥
30년 손맛에 단골 손님 북적

그가 처음부터 밥을 팔지는 않았다. 저녁에 술안주로 내놓은 반찬이 맛있다며 밥을 찾는 손님이 늘어난 것이 계기였다.
실은 예전에 기자가 국제시장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맛있는 밥이 생각나면 가는 곳이었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원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다.
자꾸만 생각나는 곳이라 예전에 찍어둔 간판 사진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리를 옮겼다는 대답이었다.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오봉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28년 동안 했다. 옮기고 나서 '오봉실비'로 이름을 바꾼 지는 2년이 되었다.
여전히 그때의 맛인지 궁금했다. 점심 메뉴 중에 납새미 조림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이 집은 밥을 압력 밭솥에 조금씩만 한다. 많은 양의 밥을 한꺼번에, 혹은 전기밥솥으로 하지는 않는다. 밥에는 완두콩이 들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밥알도 살아 있다.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서 밥이 떨어질 때도 있다.
납새미 조림은 간이 잘 배어 있고, 기본 찬으로 나오는 반찬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다. 멸치를 된장에 조려 만든 강된장을 함께 나온 쌈과 함께 먹으니 입맛이 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한 맛에 기분이 좋다.
옆자리 오랜 단골은 자리를 잡고 앉더니 밥을 알아서 푼다. 반찬도 사장이 담아둔 것을 자기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사장이 바쁜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는 미리 준비해온 현금을 놓고 나간다.
그러고 보니 주변 상인들도 밥을 큰 쟁반에 들고 갔다가 다 먹으면 다시 들고 온다. 모두 이 집 밥을 오래 먹고 싶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었다. 단골은 입을 모아 "맛있는 밥 먹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혼자 주방을 운영하느라 바쁜 사장을 배려하는 진짜 손님이었다. 이러니 "욕심내지 않겠다. 지금도 벅차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이 집 어디에도 '셀프'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가게 이름인 '오봉'은 처음에는 일본어로 말하는 쟁반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했는데 아니란다. 가게를 시작할 때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며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이다. 이 이름이면 밥은 먹고 살 거라고 했다. 30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 오랜 단골이 많아 반찬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어 더 바쁘다고 이야기한다. 경매로 받아온 생선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그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하다.
매운탕 6천 원, 갈치찌개 6천 원, 생선구이 6천 원, 납새미 조림 6천 원. 영업시간 12:00~21:00. 부산 중구 중구로 31-10. 051-245-7255.
글·사진=박나리 기자 nari@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