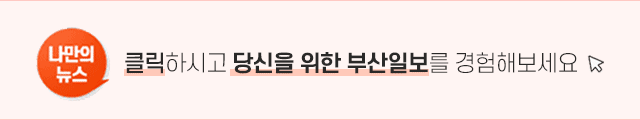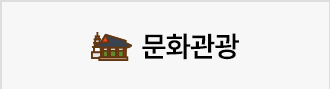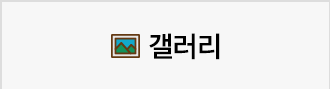프렌치 레스토랑 '메르씨엘'
 해운대 샐러드
해운대 샐러드사람들은 그에게 왜 부산에서 레스토랑을 열었느냐고 묻는다. 그의 대답은 늘 이렇다. "달맞이언덕을 한번 봐라.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서울에서 하겠는가. 프랑스에도 좋은 레스토랑은 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연 속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싶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있는 윤화영(37) 세프의 '메르씨엘'에 가며 음식에 초점을 맞추자고 마음먹었다. 명성이 음식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보았기 때문이다. '메르씨엘'은 '바다(la mer)'와 '하늘(le ciel)'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 윤 셰프는 이 이름 속에 대자연에 대한 고마움, 또 12년 동안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프랑스에 대한 감사를 담았다. 메르씨엘 테라스에서 보는 바다는 과연 시름을 잊게 해 준다.
내부 계단 시원히 비추는 통유리
물 건너온 그릇·그림 우아함 더해
해운대샐러드, 고르곤졸라피자 등
입맛에 맞게 살짝 변형한 요리들
오리가슴살 스테이크엔 소고기맛이
"보기 아닌 먹기 위한 음식 만들어"
 |
| 해운대 달맞이언덕의 새로운 명소를 예약한 `메르씨엘`. `메르씨엘`의 계단을 오르내리면 레드 카펫을 밟는 영화배우같은 기분이 든다. |
메르씨엘은 건물만으로도 명소가 될 것 같다. 통유리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레드 카펫을 밟는 영화배우처럼 비춘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그릇이 진열된 로비층은 장래를 내다본 준비인 것 같고. 1층은 코스 요리 손님이 있을 때만 문을 여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2층은 '브라스리(Brasserie)'라는 이름을 붙인 캐주얼 레스토랑이다.
미슐랭 스타급에서 쓰는 식기에다 레스토랑에 걸린 그림까지 프랑스에서 가져왔다니 보통 준비를 한 게 아닌 것 같다. 실은 지난 2008년에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열려고 준비했었단다. 건물 공사가 지연되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바라빳'이라는 국숫집을 몇 달간 하며 부산 시장도 익혔다.
시작해 볼까. 샐러드에서는 단맛이 은근하게 배어 나온다. 다음에는 뭘까, 기대감이 기분 좋다. 윤 세프가 니스식 샐러드를 변형해서 만든 '해운대 샐러드'가 인기다. 채소에 새우, 조개, 홍합 등 해산물을 섞어 해운대 맛이 나게 만들었다. 무화과가 든 고르곤졸라 피자는 베스트셀러 등극을 예감한다. 이건 사람의 입맛을 확실히 알고 만드는 것이다.
봉골레와 명란 크림 파스타를 각각 조금씩 맛보았다. 꽃이 핀 것 같이 나온 봉골레는 입맛을 당긴다. 명란 크림 파스타는 평범한 편. 파스타의 양은 의외로 적지 않다. 스테이크에 앞서 감각적인 디자인의 '9.47 나이프'에 눈길이 간다. 프랑스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쓰는 칼이란다. 고기는 칼맛이 반이라는 말을 실감한다.숙성 잘된 호주산 MB5+ 등급 와규 채끝의 씹는 맛이 보통이 아니다.
 |
| 봉골레 스파게티 |
이때쯤 우리 테이블에 들어온 윤 셰프가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초를 친다. 어떻게 해서 먹어도 소고기는 소고기 맛이니, 굳이 레스토랑 가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달팽이도 요즘에는 냉동이 많아 프랑스에서 즐겨 먹지는 않는단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뭘 먹는다는 말인가. 윤 셰프가 대신 선보인 요리가 바로 오렌지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바비큐 스테이크'. 오리 살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어떻게 요리했길래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맛이 날까. 혹시 오리고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 이 값진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이탈리아와 프랑스 요리의 차이점. 쉽게 말해 이탈리아 요리가 가정식이라면 프랑스는 귀족을 위한 요리다. 탄수화물 중심의 이탈리아 요리와 달리, 프랑스 음식은 생선이나 육류 등 단백질을 위주로 한 요리가 메인이 되고 탄수화물이나 야채가 장식인 가니시(Garnish)로 곁들여진다.
 |
| 오리 가슴살 바비큐 스테이크 |
식사를 마치고 주방 구경에 나섰다. 3개 층을 수직으로 사용한다는 주방이 크고 깨끗해서 놀랐다. 보는 사람마다 주방이 너무 크다며 줄이라고 충고한다. 프랑스 요리는 적당한 규모의 주방과 인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깨끗한 주방에서 깨끗한 요리가 나온다. 미리 1차 처리해 식재료가 흙이 묻은 상태로는 주방에 올라가지 않는단다. 이 쾌적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18명에 달한다. 고급 레스토랑은 소비해 줄 손님이 있어야 비로소 설 자리를 찾게 된다. 부산에 그만한 수요가 있을까, 슬며시 걱정이 되었다.
요리사가 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란다. 윤 셰프는 "우리 집은 재료값이 50%가 넘게 들어간다.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먹기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요리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는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이든 손님이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솔직 담백함이 음식에 녹아 있다. 실력과 경력을 겸비한 하석환 소믈리에가 그를 돕는다. 산토리프리미엄몰츠 생맥주가 맛있어 가볍게 한잔하기에도 괜찮아 보인다.
샐러드·피자 1만 7천~2만 원, 파스타 1만 8천~2만 원. 브라스리 코스 7만 원. 1층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코스 요리는 13만 원(부산국제영화제 기간부터 10만 원 정도로 인하 계획). 부가세 10% 가산.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전 2시. 부산 해운대 중동 달맞이길 65의 154. 051-747-9845.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com
사진=블로거 '울이삐' (busanwhere.blog.me) 제공
관련기사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