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만 세대/이동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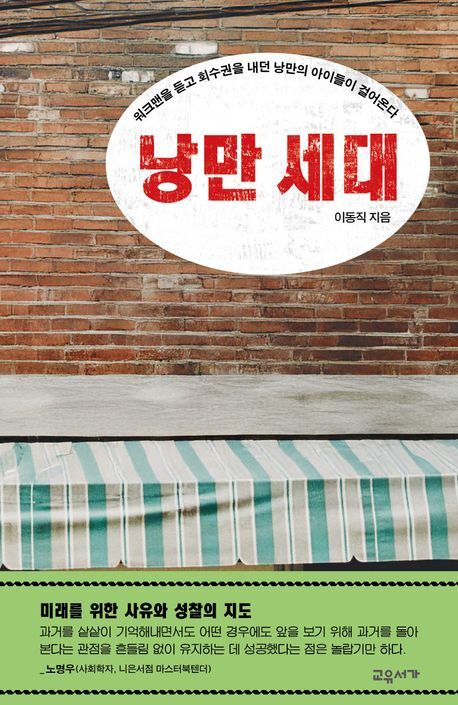
이들의 부모는 디지털이 어렵다. 이들의 아이는 아날로그를 모른다. 이들은 아날로그 정서를 디지털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어려서는 주판을 배웠고,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다. 재래식 변소에서 비데까지 경험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며 디지털의 편리함을 즐긴다. 두 시간대가 한 세대 안에 새겨져 있다. 이들은 문화적 이중 언어자이며, 동시에 두 시간대를 뛰어넘은 시간 여행자이다.
저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나 현재 60대와 50대에 이른 이들을 ‘낭만 세대’로 정의한다. 이들은 최빈국의 아이로 태어나 부유한 나라의 중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전쟁의 참상을 걷어내고 경제가 자라나기 시작할 즈음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유년기 기억을 빈곤의 언어가 아닌 놀이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첫 세대다. 학교 앞은 이들의 유토피아였다. 요즘처럼 학원 버스는 없었다. 이들이 누린 유년은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난 낭만기였다.
이들이 자라는 동안, 세상은 자주 다른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었다. 삐삐라고 부르던 무선 호출기의 유행과 사라짐을 목격했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던 이들은 이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른다. 카세트테이프를 빨리 감으려고 연필을 꽂아 돌리던 이들이 이제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다.
낭만 세대가 태어나고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을 배워 청년이 되어가던 시기의 대한민국은 ‘덧셈의 시대’였다. 모든 수치는 불어나고, 세상은 앞으로만 질주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 국가 대한민국은 산업화한 경제 대국으로 급변했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하던 명목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약 1조 8689억 달러로 세계 13위권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1960년에 태어난 이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경제 전망은 어둡고 출산율은 바닥이고 자살률은 천장을 향한다. 성장은 가라앉고 미래는 불안하다. 낭만 세대는 초고령 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경험할 첫 노인 세대이다.
문제는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낭만을 누렸던 이들이 후세에 전한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독한 차별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불안 사회다. ‘그러게 잘하든지, 아니면 잘 태어나든지’(영화 ‘내부자들’)나 ‘내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야’(영화 ‘한국이 싫어서), 혹은 ’그기 돈이 됩니까?(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라는 표현은 낭만 세대의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부모 세대는 삶이 빈곤한 생존 세대였고, 자식 세대는 희망이 빈곤한 생존 세대다. 두 생존 세대 사이에 낭만 세대가 있다. 부모 세대는 정작 자신은 그늘에서 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열심히 나무를 심었다. 낭만 세대는 그 나무 그늘에서 통기타를 치고, 민주주의를 토론했다. 그런데 고작 자식 세대에 넘겨준 시대는 끝없는 경쟁과 불공정과 차별이 만연하다고 느끼는 ‘뺄셈의 대한민국’이다. 이대로라면, 낭만 세대는 ‘이기적인 노인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낭만 세대>는 묻는다. 부모 세대의 희생을 발판으로 누린 과실을 독식한 위선적 노인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감성을 자극하는 ‘80년대 발라드 플레이리스트’만 남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동직 지음/교유서가/212쪽/1만 7000원.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